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1월 한국과 미국은 새로운 원자력협정을 맺었다. 1972년 두 나라가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한 정부 간 협정’을 맺은 지 43년 만에 개정안에 서명한 것이다. 당시 정부는 이전 협정에선 불가능했던, 우라늄 농축의 길이 열렸다고 자랑했다. 미국과의 사전협의라는 꼬투리가 붙긴 했지만, 우라늄을 20% 미만 수준에서 농축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미국은 다른 나라의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를 전면 금지하는 이른바 ‘골드 스탠더드’(gold standard)를 새 협정에선 명시하지 않았다.
미국은 원자력 협력에 차등을 둔다. 핵보유국이나 이미 농축과 재처리 기술을 보유한 나라에 대해선 기득권을 인정하지만, 다른 나라에 대해선 틈을 주지 않는다. 동맹국이나 전략적 협력국에 대해서도 사전동의 방식으로 농축과 재처리를 허용할 뿐이다. 이도 저도 아닌 나라들에 대해선 농축과 재처리를 일절 못하게 하는 골드 스탠더드를 강요한다. 실제로 미국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나 2013년 대만과의 협정에서 이를 고수했다. 한국의 우라늄 농축 가능성을 허용한 것은 그만큼 한국을 신뢰한다는 징표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이 최근 한국을 핵물질 이용과 관련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올려 파문이 일고 있다. 에너지부 산하 국립연구소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정비했다는 설명부터 윤석열 정부의 잇단 핵무장 의지 천명이 영향을 끼쳤다는 지적까지 해석이 분분하다. 한때 한국에 대해 골드 스탠더드 적용까지 유보한 미국이 갑자기 ‘한국 경계령’을 내렸으니 심상치 않다. 정부는 이를 해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하지만,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원자력연구소에서 2000년께 우라늄 농축 실험을 한 사실이 2004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의해 확인된 적이 있다. 한국이 핵개발을 시도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면서 ‘남핵 파동’이라는 말까지 돌았다. 한국은 국제원자력기구의 특별 사찰을 받았고,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될 위기에 처했다. 노무현 정부는 그해 10월 ‘핵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4원칙’을 발표하는 등 논란을 잠재우려 안간힘을 썼다. 이 파문은 4년 뒤인 2008년 국제원자력기구가 연례보고서를 통해 한국에서 모든 핵물질이 평화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평가함에 따라 일단락됐다. 핵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이처럼 어렵다.
유강문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상임이사·논설위원 moon@hani.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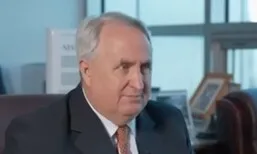




![기후위기에도 감세 정책만 내놓는 대선 잠룡들 [왜냐면]](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402/53_17435897402671_20250402503665.webp)

![한국 유일 \'여성 빙하학자\' …자연이 묻어둔 \'냉동 타임캡슐\' [.txt]](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328/53_17431240933742_20250327504802.webp)




![[사설] ‘도이치 주가조작’ 유죄 확정, 이래도 김건희 봐줄 건가](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403/53_17436725142274_20250403503835.webp)




![[단독] 교제폭력 피해자가 살인자로…31번 신고에도 보호받지 못했다](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404/53_17437212560116_20250403504325.webp)








![검찰독재정권 2022.05.10~2025.04.04 [그림판]](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404/53_17437558978226_20250404503237.webp)



![<font color="#FF4000">[단독]</font> 헌재, 프린트도 안 썼다…선고요지 보안 지키려 ‘이메일 보고’](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5/0404/53_17437420829602_5617437395501404.webp)


![<font color="#FF4000">[단독] </font>국힘 단체대화방 “김상욱 혼자 정의로운 척…탈당하라”](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5/0406/53_17439099380386_20250406500900.webp)


